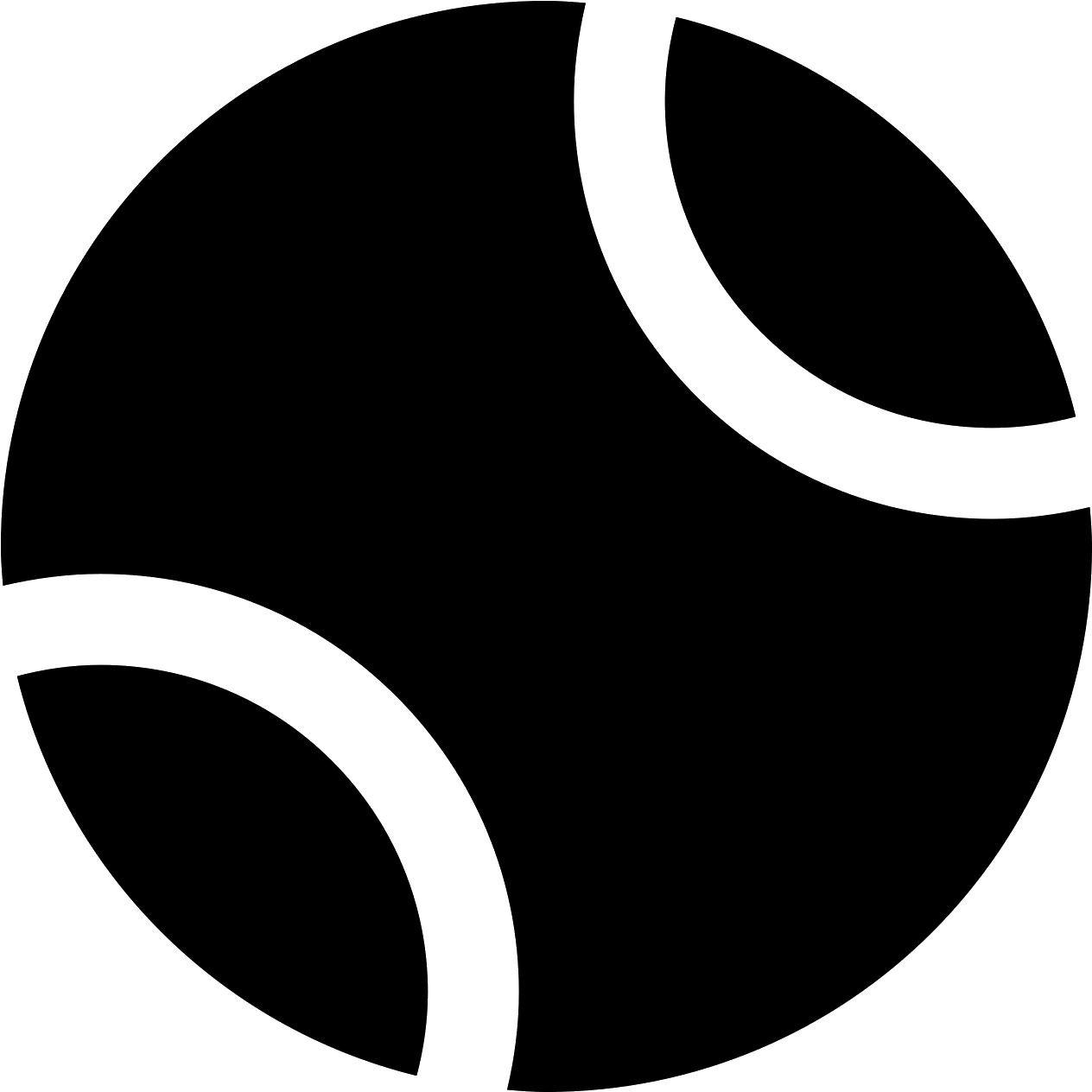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 1인칭 인터뷰
- 궁궐
- 일본도서
- 제주삼다수
- 삼성
- 독립잡지
- 리뷰쓰는법
- 책
- 비전프로
- 연방준비제도
- 코피노
- 미술아카이브
- 미셸자우너
- 갤럭시플립
- 서울여행
- oledtv
- 국제통화기금
- 갤럭시폴드
- 인정전
- 인터뷰
- 로스카츠
- 코피노 활동가
- 미술 전시
- 재패니즈브렉퍼스트
- 고궁
- 서울시립미술관
- 국내축구
- 전시
- 증강현실
- 삼성전자
- Today
- Total
글을 기록하는 장소
슬프도록 아름다운 덕수궁 본문

따뜻한 봄날을 맞아 국립현대미술관을 찾아갈 계획이었다. 예약까지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몸이 아팠다. 금요일 아침부터 목이 붓고 몸에 기운이 없더니 저녁 내내 몸져누웠다. 토요일에 일어났지만 몸 상태는 그대로였다. 계획을 엎어야 하나 고민했지만 일요일은 비 예보가 있었다. 일단 나갔다.
국립현대미술관에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까지 간 뒤 버스로 갈아타야 했다. 시청역까지 가는 데는 성공했는데 여기서 더 멀리 갈 자신이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다. 결국 원래 계획은 포기했다. 미술관은 가지 않더라도 글은 써야 했고 이미 서울까지 나오느라 2시간 가까운 시간을 써버렸기 때문에 뭐라도 가져가야 했다. 그래서 계획도 없이 덜컥 덕수궁에 갔다.

시청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앞으로 몇 걸음만 가면 덕수궁이 보인다. 대한문이 공사 중이라서 덕수궁에 찾아왔다는 느낌은 약해졌지만, 특유의 돌담길만으로도 충분히 느낌이 있다.
대한문 옆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덕수궁 돌담길’이 이어진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이문세가 1988년 발표한 ‘광화문 연가’ 초반부 가사에 이렇게 덕수궁 돌담길이 언급된다. 대중 매체에서 덕수궁을 다룬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그런데 왜 광화문 연가일까?) 그리움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노래여서 그런지 몰라도 덕수궁은 어쩐지 쓸쓸하고 적적한 기운이 감돈다. 노래 때문만은 아니다. 실제로 덕수궁은 많은 사연을 담고 있다.
덕수궁은 황궁을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 아니다. 원래는 의경세자의 아들 월산대군이 제사를 맡으며 하사받은 곳이었고, 그렇게 월산대군의 후손이 지내는 저택이 되었다. 약 100년 뒤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의주부, 현재 평안도 지역까지 피난을 갔다. 이후 한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도성 내 모든 궁궐은 불타버려 거처할 곳이 없어졌다. 머물 곳이 필요했던 선조는 월산대군 저택과 주변 민가를 여러 채 합하여 임시 거처로 삼으면서 ‘정릉동 행궁’이라 불렀다. 선조에 이어 즉위한 광해군은 정릉동 행궁을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정식 궁궐로 승격시켰다. 하지만 인조반정이 일어나며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하면서 오랜 기간 잊힌 궁궐이 되었다.


인조와 광해군의 이야기가 담긴 건물은 ‘석어당’이다. 덕수궁 중심에 있는 중화전 뒤편에 단청이 없는 건물이 바로 석어당이다. 석어당은 2층 목조 건물이다. 현재 남아 있는 궁궐 전각 중 2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이곳뿐이다. 2층 건물인 데다 단청까지 없어서 궁궐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는 덕수궁이 월산대군의 저택에서 시작된 건물이기 때문이다. 선조가 임진왜란 이후 거처했던 이곳은 광해군이 인목왕후를 가둔 곳이기도 하다. 궁중문학 ‘계축일기’에 인목왕후가 유폐 생활하는 동안 겪은 일이 묘사되어 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덕수궁(당시 경운궁)이 다시 역사의 중심이 된 것은 1897년 고종 때였다. 고종은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을미사변 이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다. 그 이후 그는 공사관이 가까웠던 경운궁에서 거처했다. 인조 이후 즉어당과 석어당만 덩그러니 남은 상태였고 고종은 이곳을 황궁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 건물을 지었다. 덕수궁의 중화전, 정관헌 등 대부분의 건물은 이때 만들어졌다. 그리고 고종은 1897년 덕수궁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고종 때에야 덕수궁은 제대로 된 황궁의 형태를 갖춘다. 그런데 다른 궁궐과 달리 황후에 침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 다시 황후를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덕수궁의 침전은 ‘함녕전’뿐이다. 황후의 침전을 대신하여 명성황후의 신주를 모신 경효전을 세웠다. 하지만 1904년 화재로 타 없어졌다. 1912년 경효전이 있던 자리에 외국 사신을 접견할 목적으로 ‘덕홍전’을 새로 지었다.
대한제국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지 10년이 된 1907년 고종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퇴위한다. 우리가 아는 덕수궁이라는 이름은 이때 붙은 이름이다. 고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순종은 경운궁을 덕수궁이라고 명명한다. 퇴위한 이후에도 고종은 1919년 승하할 때까지 덕수궁에서 머문다.

덕수궁을 돌아보면 조선시대 궁궐이라고 할 수 없는 서양식 건물이 보인다. 이 건물은 ‘석조전’이다. 석조전은 1897년 대한제국 선포 후 건립을 계획하여 1900년에 착공하였다. 전통 궁궐은 왕의 집무공간인 편전과 취침공간인 침전 등이 따로 나뉘어 있다. 이와 달리 석조전은 침전, 편전을 하나로 통합한 서양의 궁전 같은 건물을 표방하며 만든 건물이다. 설계는 영국인 건축기사 J. R. 하딩이 맡았고, 엄격한 비례와 좌우대칭이 돋보이는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제작되었다. 기존 궁궐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만들었기에 덕수궁과 좀처럼 어우러지지 못한다. 그런데 석조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석조전은 1900년 착공 당시 1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만든 건물이었지만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 1910년 12월 1일 완공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3달 전인 8월 29일에 이미 대한제국은 경솔국치(庚戌國恥)를 겪고 멸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석조전은 대한제국의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지만, 대한제국의 건물로 쓰이지 못한 비극적인 건물이 되었다. 이후 1933년 일제에 의해 일본 근대 미술품을 전시하는 ‘이왕가미술관(李王家美術館)‘으로 쓰인다. 대한제국의 슬픈 역사를 오롯이 보여주는 가슴 아픈 건물이다.

수백 년 자리를 지킨 궁궐에 저마다 사연이 많겠지만 덕수궁의 이야기는 유독 마음이 아프다. 임진왜란으로 궁궐을 잃고 찾아온 임시 거처에서 시작하여 거액을 들여 만든 황궁이 일제의 미술관으로 쓰이기까지, 덕수궁은 조선이 본래 궤도에서 어긋날 때 역사의 중심에 등장했다. 어쩌면 덕수궁은 시작부터 슬픈 이야기가 쌓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지 모른다. 크기가 작아서 잔잔하고 조용한 편인데 속사정까지 알게 되면 묘하게 쓸쓸한 느낌까지 든다.
날이 좋을 때면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덕수궁에 가곤 했다. 덕수궁에 가서 벤치에 멍하니 앉거나 책을 읽으면 마음이 차분해졌다. 덕수궁은 내 마음의 안식처 중 하나였다. 안타깝게도 요즘 덕수궁은 시끌시끌하다. 몇 년 전부터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은 다양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시위가 자주 일어난다. 마이크를 붙잡고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사람과 차에서 흘러나오는 강한 음악에 덕수궁의 잔잔한 정취를 느낄 수 없어졌다. 600년 넘도록 여러 정치적 사건과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몸서리를 앓았던 덕수궁이었는데 현대에 와서도 그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어쩌면 이마저도 덕수궁의 슬픈 운명은 아니었을까.

<한국잡지교육원 취재기자 24기 김호준>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곳이 '국밥천국 지상낙원'? - 『합천돼지국밥』 (0) | 2023.05.30 |
|---|---|
| 오래 입어야 예쁘다…웨어하우스의 청바지 Lot 1001의 속 이야기 (0) | 2023.04.13 |
| 편안하고 다정한 고궁, 창덕궁에 가다 (0) | 2023.04.13 |
| 음식으로 만든 아름다운 애도 - 미셸 자우너, 『H마트에서 울다』 (0) | 2023.03.27 |
| 글로 마음을 움직여보자 - 가와사키 쇼헤이,『리뷰 쓰는 법』 (0) | 202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