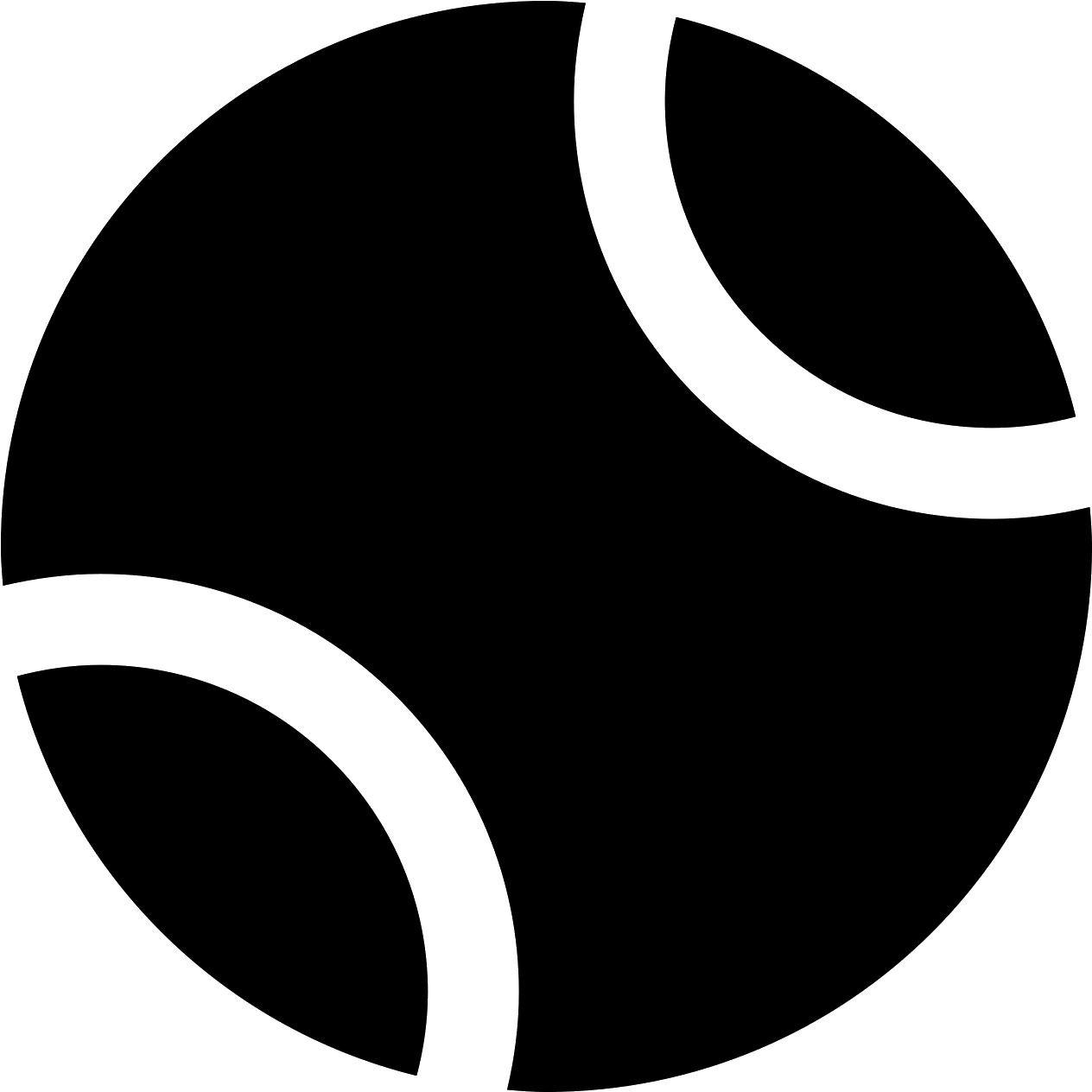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 삼성전자
- 삼성
- 제주삼다수
- 일본도서
- 서울여행
- 독립잡지
- 책
- 연방준비제도
- 미셸자우너
- 인터뷰
- 로스카츠
- 갤럭시폴드
- 국내축구
- 리뷰쓰는법
- oledtv
- 전시
- 궁궐
- 코피노
- 고궁
- 국제통화기금
- 비전프로
- 1인칭 인터뷰
- 서울시립미술관
- 코피노 활동가
- 갤럭시플립
- 미술 전시
- 인정전
- 재패니즈브렉퍼스트
- 증강현실
- 미술아카이브
- Today
- Total
글을 기록하는 장소
편안하고 다정한 고궁, 창덕궁에 가다 본문

맑고 화창한 날을 맞아 창덕궁 나들이에 나섰다. 15도 안팎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에서 봄날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해 3월 창덕궁 전각 창호 개방 행사를 맞아 방문한 이후 약 1년여만의 일이었다. 1년이 지난 창덕궁은 무엇이 달라져 있을지 궁금했다. 해설사를 따라 창덕궁을 둘러보았다.
창덕궁은 조선시대 두 번째로 만들어진 궁으로 1405년(태종 5년)에 완공되었다. 경복궁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임금들은 두 곳을 오가며 거처하였다. 임진왜란 때 화재로 모든 궁궐이 사라졌으나 창덕궁은 광복군 때에 재건되었다. 이후 흥선대원군에 의해 경복궁이 중건되기 전까지 임금이 거처하는 법궁(法宮)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가장 오랜 기간 임금이 거처한 궁궐이었다.
경복궁과 창덕궁은 매우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경복궁은 광화문(光化門)-흥례문(興禮門)-근정문(勤政門)으로 이어지는 직선적인 구조와, 큰 규모가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근정문을 지나 근정전(勤政殿)을 마주할 때 압도되는 느낌을 받는다. 한편, 창덕궁은 자연 지형에 따라 지어져 건물이 자유롭게 흩어져 있다.. 돈화문(敦化門)을 지나 금천교(錦川橋)를 건너도 인정전(仁政殿)을 마주할 수 없다. 덕분에 창덕궁은 무겁지 않고 편안하다. 19세기에 새로 지은 경복궁과 달리 아직 여러 건물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임금이 머물며 오랜 기간 법궁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창덕궁의 매력이다.

창덕궁을 대표하는 건물은 역시 인정전이다. 창덕궁의 정전으로 궁궐의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였다. 경복궁이 화마를 겪고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 내내 조선을 상징하는 건물 중 하나였다.
인정전을 지나며 해설사에게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다. 대개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임금의 즉위식을 정전에서 성대하게 치르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실제로 즉위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드물었다고 한다. 흔히 새로운 임금은 선왕이 서거하면서 즉위한다. 조선은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장례를 아주 엄중하게 다루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전을 활용하여 성대한 즉위식을 벌일 수 없었다. 그래서 보통 장례가 6일째 되는 날에 인정문 앞에서 간략하게 치렀다고 한다. 매체를 통해 접한 즉위식과 현저히 다른 이야기가 무척 재밌었다.

인정전의 박석(薄石)은 원형을 잘 유지한 창덕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박석은 마당에 까는 얇고 널찍한 돌을 의미한다. 인정전의 박석은 모두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지 않다. 박석 중 깨끗한 부분은 1970년대 복원하는 과정에서 화강암을 다듬어서 만든 것이다. 그보다 작고 한눈에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부분은 조선시대의 원형을 유지하였다. 70년대에 복원한 박석은 원형에 비해 너무 반듯하여 멋이 떨어진다. 만약 창덕궁이 원형을 지키지 못했더라면 박석의 아름다움도 엿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인정전을 지나면 선정전(宣政殿)을 만날 수 있다. 선정전은 임금이 신하와 함께 나랏일을 보던 편전이었다. 선정전의 특징으로 청기와 지붕을 꼽을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궁궐 건물 중 청기와 지붕은 선정전이 유일하다. 맑은 햇살을 받으면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영롱한 빛깔을 볼 수 있다. 창덕궁에 방문할 때마다 선정전의 청기와 지붕이 제일 오래 기억에 남는다.

다음은 희정당(熙政堂)이다. 희정당은 임금의 침전이었다가 조선 후기에 편전으로 활용되었던 건물이다. 정면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놓여 있다. 이는 1917년 대조전이 화재를 겪은 이후, 복구하면서 만든 부분이다. 본래 희정당은 15칸의 작은 건물이었으나 이때 복구하면서 경복궁 강녕전을 헐어서 지으면서 55칸의 거대한 건물이 되었다.

가이드의 마지막은 낙선재(樂善齋)였다. 낙선재는 24대 헌종 때 임금의 서재로 만든 건물이었다. 그 옆에 석복헌(錫福軒)과 수강재(壽康齋)가 있는데, 석복헌은 낙선재와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다. 석복헌에서는 간택 후궁인 경빈 김씨가, 수강재에서는 대왕대비 순원왕후가 머물렀다. 하지만 석복헌이 지어진 지 1년 만에 헌종이 죽었고, 경빈 김씨가 궁에서 나오면서 석복헌은 한동안 비어 있었다.
낙선재의 특징은 단청이 없다는 점이다. 낙선재처럼 단청이 없는 건물을 백골집이라고 부른다. 높은 누마루에서는 청나라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데, 그 밑에 아름다운 빙결무늬가 있다. 빙결무늬는 뒤에 있는 아궁이에서 불이 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외에도 낙선재 정문 장락문의 현판에 흥선대원군이 직접 쓴 글씨가 남아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낙선재는 근래까지 황실 가족이 머문 건물이었다. 덕혜옹주와 이방자가 1989년까지 거주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본래 모습과 많이 달라졌다. 지금 낙선재의 모습은 1990년대 조선시대 모습으로 복원한 것이다. 가장 오래 사람이 머물렀기에 사람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왕비의 침전으로 사용되었던 대조전과, 희정당의 일부는 공사로 볼 수 없었다. 공사는 올해 6월 7일에서야 끝날 예정이기에 올봄에는 볼 수가 없을 전망이다. 개화기를 거치며 만들어진 서양식 주방을 두고 있는 점이 대조전의 매력이었는데, 이번에는 보지 못해서 아쉬웠다.
창덕궁의 매력은 전각(殿閣)에서 그치지 않는다. 북쪽에 위치한 정원인 후원(後苑)은 창덕궁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상시로 볼 수 있는 전각과 달리 후원은 예약제로 들어갈 수 있으며 해설사가 동행해야만 관람할 수 있는 제한 구간이다. 날이 좋아지면 예약이 매우 치열해져서 후원을 보는 일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후원 관람을 예약하여 전각과 함께 보는 것을 추천한다.
창덕궁은 서울의 다른 궁궐에 비해 퍽 편안하고 다정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가장 오랜 기간 임금들이 거처하였고, 근래까지 황실 가족에 머물렀던 곳이기에 사람의 흔적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는 창덕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창덕궁의 매력 때문인지 그곳에 가면 늘 마음이 편안해진다. 올봄에 고궁으로 나들이를 간다면 창덕궁은 아주 탁월한 선택일 것이다.
[창덕궁 정보]
<전각 관람 시간>
2~5월 09:00~18:00 (입장 마감은 17:00)
6~8월 09:00~18:30 (입장 마감은 17:30)
9~10월 09:00~18:00 (입장 마감은 17:00)
11~1월 09:00~17:30 (입장 마감은 16:30)
<전각 관람 요금>
대인(만 25세~만 64세) : 3,000원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7세~만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 : 무료
※ 후원 관람은 홈페이지(창덕궁 - 세계유산 (cdg.go.kr))를 통해 예약 가능
자세한 정보는 창덕궁 홈페이지 참조.
<한국잡지교육원 취재기자 24기 김호준>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곳이 '국밥천국 지상낙원'? - 『합천돼지국밥』 (0) | 2023.05.30 |
|---|---|
| 오래 입어야 예쁘다…웨어하우스의 청바지 Lot 1001의 속 이야기 (0) | 2023.04.13 |
| 슬프도록 아름다운 덕수궁 (0) | 2023.04.13 |
| 음식으로 만든 아름다운 애도 - 미셸 자우너, 『H마트에서 울다』 (0) | 2023.03.27 |
| 글로 마음을 움직여보자 - 가와사키 쇼헤이,『리뷰 쓰는 법』 (0) | 202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