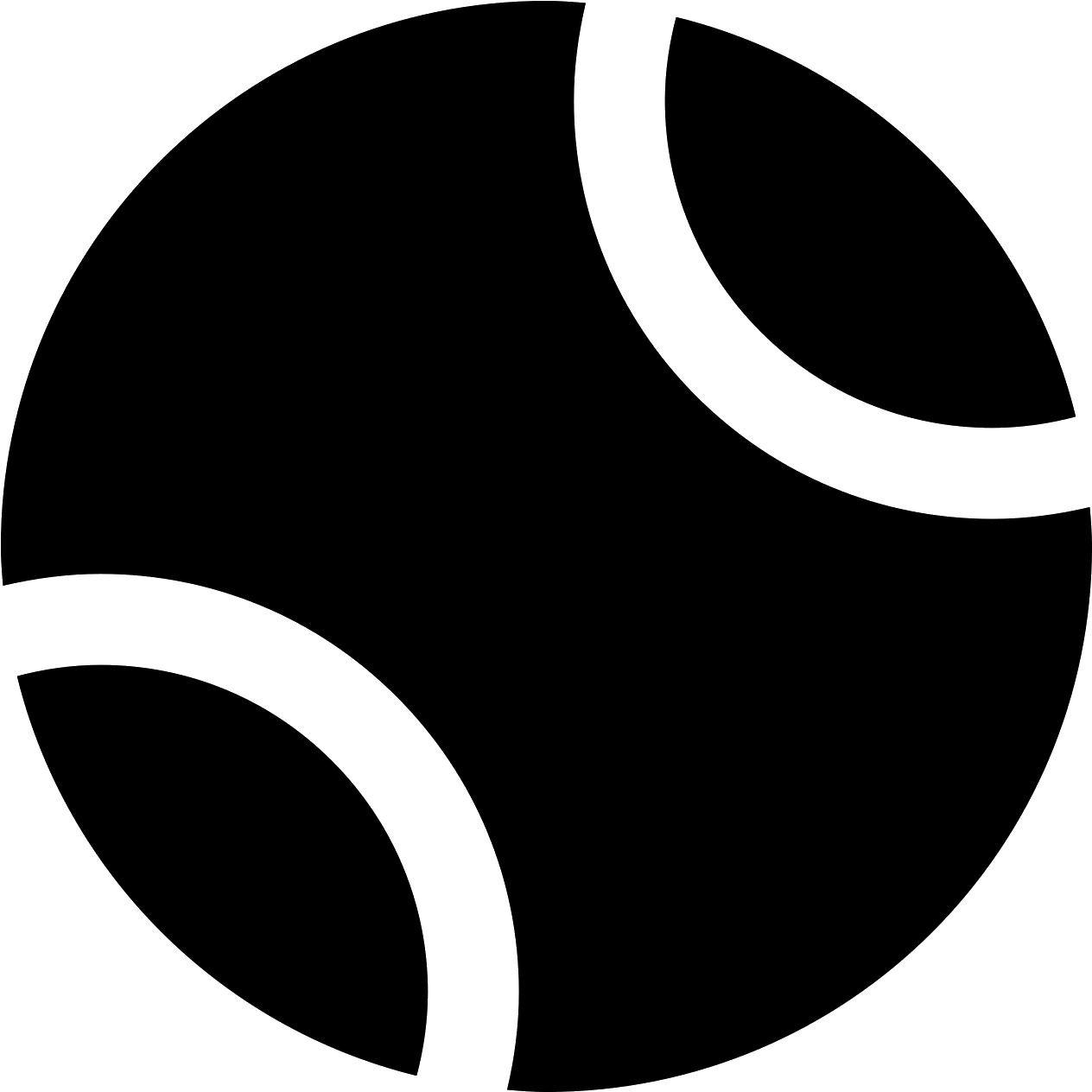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 전시
- 삼성전자
- 갤럭시플립
- 국내축구
- 리뷰쓰는법
- 코피노 활동가
- 갤럭시폴드
- 국제통화기금
- oledtv
- 책
- 로스카츠
- 고궁
- 서울여행
- 재패니즈브렉퍼스트
- 1인칭 인터뷰
- 궁궐
- 코피노
- 독립잡지
- 연방준비제도
- 비전프로
- 미셸자우너
- 미술 전시
- 인터뷰
- 인정전
- 서울시립미술관
- 미술아카이브
- 제주삼다수
- 일본도서
- 증강현실
- 삼성
- Today
- Total
글을 기록하는 장소
“정답은 현장에 있어요”...경기일보 홍승주 기자를 만나다 본문
“하루 종일 취재해서 기사 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아침마다 새로운 기사를 발제하려니 정말 힘들어요. 언제쯤 기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홍승주 기자는 한국잡지교육원 취재기자 18기 출신이다. 지난해 9월 경기일보에 입사해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신참이다. 매일 기사와 씨름하느라 정신이 없어 다음 발제할 주제는 생각하기도 힘들다.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에도 흔쾌히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답변이 빼곡하게 적힌 종이를 꺼내며 후배를 만나게 돼 무척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다.
“후배들과 인터뷰하러 간다고 동기들에게 연락했어요. 다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인터뷰 준비를 했어요. 아무쪼록 인터뷰가 도움이 되길 바라요.”
교육생 시절의 홍승주 기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 “기자를 꿈꿔본 적은 없었어요”
홍승주 기자는 한국잡지교육원 취재기자 18기 과정 수료 후, 현재 일간지 <경기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교육원을 오기 전까지 기자를 진로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글쓰기를 좋아해 글 쓰는 직업을 하고 싶었지만 기자를 꿈꿔본 적은 없었어요. 그저 취재기자 과정이 국비 지원 사업이라 신청했죠. 교육원을 다니면서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교육생이 ‘인터뷰’를 어려워한다. 홍승주 기자도 마찬가지다. 현직 기자인 지금도 인터뷰가 힘들다. 취재기자 과정 당시의 홍 기자는 인터뷰 섭외에 난항을 겪었다. 포트폴리오 인터뷰를 준비하며 아동문학 전공 대학교수를 찾아갔지만, 섭외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그 교수에게 잡지교육원 16기 선배를 소개받아 인터뷰했다. 그 선배와의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인터뷰 섭외가 어려워도 직접 부딪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일이었다.
교육원을 다니면서도 진로가 불확실했던 홍 기자는 현장 취재를 경험한 후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현장취재 기사는 오마이뉴스 메인에 올랐다.
한창 교육에 스트레스를 받던 시기, 유해 발굴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보고 카메라를 챙겨 훌쩍 대전 골령골로 떠났다. 골령골은 1950년 한국전쟁 때 단일 지역 최대 민간인 학살 현장이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가족의 유골을 찾는 조사단과 유가족을 만났다. 깜깜해질 때 집에 돌아와 기사를 썼다. 기사는 오마이뉴스 메인에 올랐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유해 발굴 봉사자 모집 기사를 쓴 시민기자에게 연락했다. 그 기자가 건네준 조언이 지금의 홍승주 기자를 있게 했다.
“그 시민기자분이 해주신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홍 기자님이 여기 왔으니까 이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거다, 앞으로도 현장성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 해주셨어요. 이게 기삿거리일까? 내 기사가 메인에 올라갈까? 라고 고민했으면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현장에서 부딪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 수료 후 월간지 잡지기자로 일하던 그는 더 깊이 있게 취재할 수 있는 탐사보도를 꿈꿨다. 입사한 지 1년이 채 안 돼 근무하던 매체에서 나와 일간지 기자 시험을 다시 준비했다. 그렇게 2022년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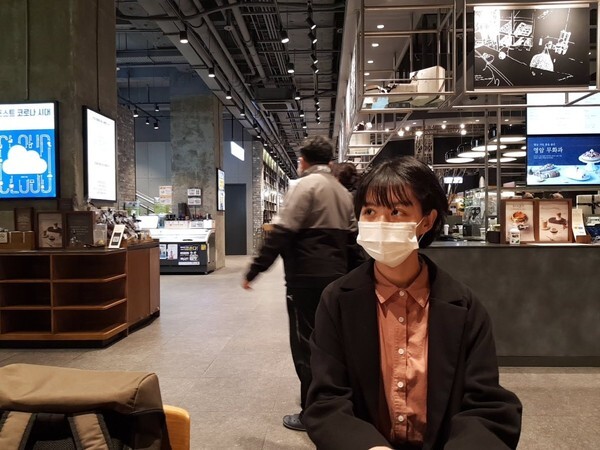
◆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일간지 기자의 하루는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간다. 아침 8시에 오늘 취재할 기사를 발제하고, 오후 1시 반까지 어느 정도 완성한다. 신문 1면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지면 구성은 3시에 확정된다. 그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맡은 기사는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기사를 완성하면 어느덧 6시다. 그마저도 갑작스레 큰 사건이 발생하면 내일로 미뤄진다. 당직기자로 사무실에 남는 날이면 늦은 밤까지 기사를 놓지 못한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이다.
“기사를 쓰는 시간이 따로 없어요. 취재하면서 노트북에 틈틈이 씁니다. 녹음도 좀처럼 하지 않아요. 녹음을 해도 다시 들을 시간이 마땅치 않죠.”
오늘 기사를 마무리하기도 버거운데 또 새로운 기사를 준비해야 한다. 데스크에 깨지고 인터뷰는 여러 차례 거절당한다. 흘러가는 일정에 치이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여전히 어려운 일 투성이다.
처음 신문사에 왔을 때는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야 했다. 인천의 한 경찰서를 아침마다 갔다. 당직 형사나 교통조사팀에게 사건이 있는지 물어봤다. 없다고 하면 인사한 뒤 돌아 나왔다. 경찰서에 찾아가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빙글빙글 돌기를 반복했다.
“최근엔 문화가 바뀌어 경찰서를 돌아 다니는 것만으로 사건을 알아내기 힘들어졌어요. 아무것도 못 알아왔다고 선임기자나 데스크가 혼내지는 않아요. 다만 제 담당구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다른 언론보다 한 줄은 더 알아내야 한다고 당부하죠.”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빌라를 40~50채 매입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가 오가던 경찰서가 사건 초반 수사를 담당했다. 데스크는 홍 기자에게 사망자의 실명과 거주지 주소를 알아 오라고 지시했다. 수습기자의 첫 임무가 시작됐다.
다른 언론은 집 주소를 구해 고지서가 쌓인 우편함을 찍어 보도했다. 그는 남들처럼 좋은 기사를 쓰고 싶었다. 하지만 수습기자에게 호락호락한 사건이 아녔다. 형사과장에게 주소를 알려 달라고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거절만이 되돌아왔다. 집요한 전화 끝에 동 이름은 들을 수 있었다. 딱 거기까지였다.
아는 것은 동 이름뿐이었다. 집을 찾기에 턱없이 부족한 정보였다. 기사 사진을 참고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할 줄 아는 경험도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수습기자는 하는 수 없이 무턱대고 찾으러 나섰다. 동 주소만 보고 온 동네를 꼭두새벽부터 들쑤시고 다녔다. 늦은 밤이 다 되도록 거주지 찾기는 계속됐다.
그러다 어느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다.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다가가 보니 방송사 기자들이었다.
“기자 2명이 서 있었어요. 다가가 대뜸 ‘선배님!’ 이라고 인사했죠. 뭐라도 알아낼 수 있을까 대화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 촬영 기자가 과거에 이 지역이 출입처였던 분이었죠. 남 일 같지 않다며 여러 도움을 주셨어요.”
촬영 기자는 사진이 잘 나오는 촬영 각도를 알려주는 등 여러모로 그를 도와줬다. 그는 덕분에 멋진 현장 사진을 남겼다. 현장에서 이웃 주민과 인터뷰도 얻어 기사를 만들어 냈다. 수습기자가 만든 첫 성과였다. 밤낮 가리지 않고 두 발로 뛰며 고생했기에 얻을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
취재기자 18기 시절 홍승주 기자의 모습. [사진: 홍승주 기자님 제공]
그의 목표는 탐사보도 잘하는 기자다. 전국언론과 달리 지역언론은 지역 내 사건이 발생하면 경과를 오랫동안 추적한다. 주민을 인터뷰해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덕분에 깊이 있는 취재를 경험하며 탐사보도의 중요성을 느꼈다.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제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주목받지 못한 문제를 파헤쳐 진실을 찾는 탐사보도를 해 보고 싶습니다. ‘탐사보도’ 하면 떠오르는 기자가 되고 싶어요.”
홍승주 기자는 같은 길을 걷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건넸다.
“동기들과 잘 지내길 바라요. 저도 힘들고 지친 순간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동기들이 큰 힘이 됐어요. 같이 한강공원으로 놀러 가고, 거기서 기삿거리를 찾기도 했죠. 동기들과 즐겁게 보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열심히 글 쓰는 것도 좋지만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길 바랍니다.”
취재: 김호준, 한정호
사진: 김호준
<한국잡지교육원 취재기자24기 김호준, 한정호>
'인터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김병한 씨와 함께한 술자리 (0) | 2023.05.30 |
|---|---|
| 스케이트가 아닌 펜을 잡고 결승선을 향해...임준환 씨의 새로운 시작 (0) | 2023.05.30 |
| 장애아동에서 장애인 교사로...이인수 씨의 바람 (1) | 2023.05.30 |
| "꿈은 포기하면 안 돼요"...강규원 씨의 굳은 의지 (1) | 2023.05.09 |
| "잡지는 일상을 보는 특별한 시선"...김민지 씨가 느낀 잡지의 매력 (0) | 2023.03.27 |